‘아름다운 삶을 권유하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의 후원전시회. 24명의 참여 작가 중 세 명의 미술가를 나누어 만났다. 작가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총3부에 걸쳐 싣는다 ... <편집자>
고양 작업실로 박은태 선생을 찾아갔다. 선생의 고향은 전남 강진. 내 고향인 충남과 상관이 없는데도 고양이 고향처럼 느껴지고 푸근했던 건 소탈한, 선생과 작업실의 인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림이 좋다, 사람이 좋다’ 딱 그런 느낌.

[사진1] 소탈한 박은태 선생 ⓒ신유아
선생은 초라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을 그려왔다. 한데 권유하다 후원전시회 ‘아름다운 삶을 권유하다’에는 짙고 푸른 밤의 ‘우수리스크의 달’과 붉은 노을 드리운 ‘조탑마을 방앗간’을 내어놓았다. 그 까닭을 물었다. 팔려고 그린 그림이라고, 일단은 기금전시회에서는 ‘팔려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라는 간단 답변이 돌아왔다.
“나도 재미있는 달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딴짓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내가 내 작업을 못 믿어서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나….”
“혹시 팔릴까 그림을 작게도 그려보지만, 시간만 똑같이 들고 안 팔리는 것은 똑같고.”
같이 크게 웃었지만, 그림이 팔리지 않아도 한눈 역시 팔지 않은 ‘외길 인생’에 고개가 숙여졌다.
낙도의 미술 교사가 꿈이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선생의 내공은 녹록지 않은 삶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다.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하며 동생 둘을 건사하는 삶이었다.
“좋아했는데 꿈은 자꾸 멀어지는 거지.”
어려서도 뭔가 그리는 걸 좋아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에서 주는 메달을 받을 만큼 주변의 인정도 받았지만, 화가의 꿈은 자꾸 멀어져 갔다. 중학교 때는 학교 끝나면 미술부 친구들이 정자나무 밑에서 합판 펴놓고 그림 그리는 걸 보며, 20kg 농약 통을 지고 논에 일하러 가야 했고. 공업 고등학교 때는 아예 미술 시간이 없었다. 교련 선생님이 특활 시간에 사군자를 가르쳐준다는 말에 매주 목요일마다 무거운 벼루를 싸 들고 다녔지만 그런 시간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졸업 후 공장에 다녔다.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그림에 대한 갈망 아니었을까. 건물 2층에 써 붙인 ‘화실’이란 느낌이 부러워 ‘다실’이란 간판만 봐도 화실로 보였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냥. 괜히. 물어보기도 했다. 다닐 것도 아니면서.
공장 야유회를 간 남이섬 강가를 걷다가 그림 그리는 젊은 남자를 보았다. ‘관심 있냐, 있다, 다음 주 일요일 경복궁에서 보자.’ 꼭 연애질 멘트를 날리는 듯한 첫 만남이었다. 상고를 나와서 외무부 말단 공무원을 하던 그이가 그렇게 화구박스도 사주었다. ‘나는 그림을 못 하나 보다’에서 ‘아 나도 그림 그릴 수 있다’라는 전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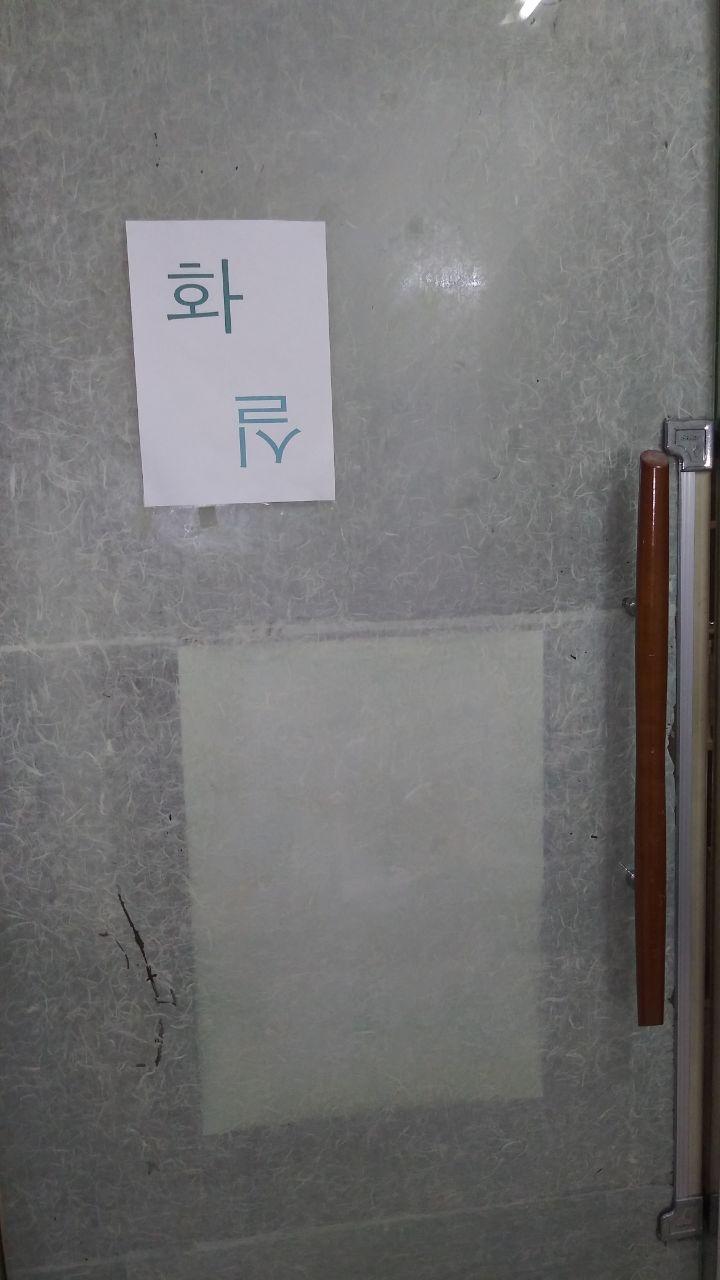
[사진2] 선생의 작업실 이름은 그냥 ‘화실’. 같은 층 병원에 볼일 있어 온 할머니들이 화장실인 줄 알고 볼일 보러 들어오기도 한다 ⓒ권유하다
주경야독의 삶. 취미반과 입시반을 거쳐 27살이던 87년 미대에 입학했다. 꽉꽉 차오른 갈망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선생을 이끌었다.
“아마 87년 6월 항쟁과 7, 8월 대투쟁을 겪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런 그림 안 그리고 아마 교사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선생은 낙도의 미술 교사라는 꿈을 다르게 이룬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작 전남의 낙도에 가진 않았지만. 먹고 사는 걸 넘어서는 모질고 독함으로, 안빈낙도라는 낙도엔 이미 정착해 있으니 말이다.
울었다
사회주의 미학 개론서를 읽으며, 가지고 다니는 학생수첩 앞장에 ‘세상을 바꾸는 그림을 그리자’는 문구를 썼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상은 작품과 작가의 관점과 작가의 삶이 같아야 한다는데 딱 박 선생에게 맞는 조합이다.
편안한 인상이되 허술함은 느껴지지 않는 선생에게 ‘이런 그림’의 길을 포기하고 싶던 적은 없었는지 물었다. 생계가 가장 힘든 일이었고. 노동미술위원회 6년의 활동 속에 작업은 못 하면서 현장만 쫓아다녀야 했고. 후배는 들어오지 않아 안 굴러가는 느낌이던 때를 말한다. 지치고 소모되는 느낌의 이 시기를 이겨내고. 서로 이해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는 건 더 힘들 수도 있었지만, 이제껏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내올 수 있었다고.
선생이 울었던 이야기 두 꼭지를 들었다. 한 번은 세월호 참사 관련 그림을 크게 그리고, 오래 작업할 때였다. 미대생들이 찾아와 의례적인 인터뷰 뒤 “세월호 관련 작업은 왜 하셨어요?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일 하신 거 아녜요?” 물었다. 그 ‘어떤 다른 생각’에 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었다. 우리가 사회를 잘 못 만들었다는 반성이었다. 더 유복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사회를 안 보고, 보더라도 그걸 기회로 활용하는 미래에 대한 우려였다. 물론 아직 젊은 그들이 앞으로 새로이 공부하고 또 다른 사회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다른 한 번의 눈물은 대학 입학하고 학교 건물에서 환한 대낮의 풍경을 바라보면서였다. 공장건물에 깜깜할 때 들어가서 깜깜할 때 나오고. 쉬는 날은 격주 일요일 정도였던 날들. 아파서 조퇴해서 병원에 갈 때면 아픈 거보다 밖에 한 번 나왔다는 느낌이 크던 날들. 펑펑 흘린 눈물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지하 생활자, 두더지의 터널 같은 날들을 지나와서였을까. 평생 그렇게 살아갈 이들을 두고 와서였을까.

[사진3] 기다리는 사람들 ⓒ박은태
2015년 ‘기다리는 사람들’ 전시를 준비하는 작가 노트엔 이런 구절이 있다. ‘여전히 그들은 내 작업 안에서 대상화되어 나타난다. 내 작업의 한계이다. 그건, 내 성장 과정에서 도망가고픈 대상을 내 그림의 소재로 삼았고, 나는 관찰자로 그들을 타자화시켰다. 삶의 처지는 늘 같았지만, 내 안에 막을 만들어 그들에게서 분리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젠 내가 조금 더 그들 안으로 다가설 수 있는 나이가 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가 내 작업과 삶의 과제이다.’
나를 닮은 동료, 가족, 친구, 이웃을 담고 그 안에 다시 나를 담는 작품들. 대상화에 머물지 않고 화폭의 사람들이 주체로 서는 그림이라는 평을 이미 받고 있으니. 선생의 과제는 많이 풀려가고 있는 듯하다. 무엇을 하든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 박은태 선생이 권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 자본이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로운 세상이지.”
선생과 옆지기인 서수경 선생도 미술가이지만 고등학생인 아들내미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 “세 사람이 그림 그리면 누가 버냐?”는 주변의 물음에 선생의 답은 ‘왜 사냐 건 웃지요.’가 아닐까 싶다.
[권유하는 사람들] ④ 신학철 ‘화가 이순신’ 보러 가기
[권유하는 사람들] ⑤ 임옥상 ‘붓은 칼이다’ 보러 가기
글
김우
권유하다 편집위원
